
한솔 칼럼, AI 앞에서 더 무거워진 기자의 판단 |
▶AI는 빠르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도입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 ▶기사의 무게는 사람이 안다 ▶신뢰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
AI가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
생성형 AI가 언론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지만, 기사의 최종 책임만큼은
여전히 기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요즘 언론 현장에서 생성형 AI 이야기를 꺼내면 반응은 둘 중 하나다. “이제 안 쓰면 뒤처진다”거나, “쓰다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라는 말이다. 둘 다 틀리지 않다. 다만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생성형 AI는 이미 언론 현장에 들어와 있다. 자료를 정리하고, 기사 구조를 잡고, 영상 자막과 나레이션 초안을 만들어 준다. 분명 편리하다.그러나 그 편리함이 곧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AI는 빠르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능숙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사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
취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판단이다. 어떤 사실을 쓰고, 어떤 표현을 삼키고, 어떤 맥락을 살릴지 결정하는 일은 결국 기자의 몫이다. AI는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최근 언론인들과 함께 AI 활용을 주제로 교육과 포럼을 진행하며 확인한 사실이 있다.
기자들은 AI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기준 없이 쓰게 되는 상황을 가장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입’이나 ‘금지’가 아닌 기준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가이드라인,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선택했다.
AI는 보조 도구일 뿐이며, 사실 확인과 최종 판단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원칙.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쓰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자와 언론사에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각 언론사는 자신의 현실에 맞는 내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술은 앞으로 더 정교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언론의 기준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 신뢰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하나의 기사, 하나의 판단, 하나의 책임을 통해 쌓인다.
AI 시대에도 기사를 쓰는 손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 역시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일이 지금 언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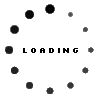
댓글0개